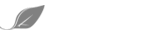내년부터 우리 학과에 적용되는 신규 커리큘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아래 조선일보 기사에서 일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學科는 손 못대"…
전공·일자리 미스매치 눈감는 교수들,
조선일보, 2015년11월26일
25일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소프트웨어 실습실에서 진행된 '프로그래밍 연습' 수업 시간.
"지난주에 덧셈·뺄셈 했으니까 오늘은 곱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조교의 말에 "맙소사, 곱셈이래"란 말과 함께 웃음이 터졌다. 그러나 이 컴퓨터공학부 기초 전공 수업에선 웃지 못하고 식은땀 흘리는 학생이 적지 않았다. 비(非)공대생이 수강생 59명 중 18명이나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제일 기초적인 수업이라는데 쉽지 않네요." 한
경제학부 학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청년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가에는 문과 학생들의 '공대 수업 듣기' 바람이 불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까지 공학 전공자는 27만7000명 부족하고, 인문·사회 전공자는 6만1000명
넘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 반발 탓 늦어지는 대학 개혁
"'독일 대학보다 한국 대학에 독어독문학과가 더 많은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은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올해 초 본지 인터뷰에서 '공급자
위주'의 현행 대학 교육은 바뀔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회
수요에 맞도록 학과 조정 등을 포함한 대학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미였다. 전공·일자리 미스매치의
심각성은 대학들이 인식하고 있다. 건국대는 기존 15개 단과대, 73개 전공(학과)을 63개 학과로 통합하기로 했고, 한양대는 "자연·공학 인재의 금융계 진출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2017학년도부터 경영학과 신입생의 10% 이상을 이과 출신으로 뽑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대학은
교수 사회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보직 교수는
"솔직히 외국 유학 다녀와 학생들 '일자리 전쟁'
실정은 모르고,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관심이 쏠린 교수들도 적잖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올해 초 학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학내 반발에 부딪혀 주춤하고 있다.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학과가 아닌 단과대별로 학생을 모집한 후 학생들이
2학년 2학기 때 과를 선택하게 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학과는 정원을 점차 줄이려는 계획이었다. 기존에 인문·사회·예체능 중심으로 운영되던 숙명여대는 내년에 첫 공대 신입생이
입학한다. 숙대 측은 "사회는 계속 변하는데 현재의
대학 학과 구조는 수십 년째 바뀌지 않았다"면서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선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숙대에 공대생이 생기기까지 진통은 적잖았고, 음대·미대 및 무용과·체육교육학과를 예술대학으로 묶는 등 당초 학제 개편안
일부는 교수 등의 항의가 거세 결국 무산됐다. 영남대 역시 최근 진로·취업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느라 안간힘이지만, 정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교수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 "뽑을 인재가 없다"
대학 입학 전부터 적성이 아닌 '수능 점수 맞춘' 대학·학과 진학도 문제다. 20년간
대입 상담을 한 입시 전문가는 "우리나라 수험생 중 약
20%는 소신껏 학교나 학과를 정하지만, 나머지 80% 정도는
입시 점수에 맞춰 학교·학과를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계열별 취업률(2013년 기준)은 의약 계열(81.4%)에서
가장 높고, 공학(75.0%)·자연(61.7%)·사회(61.5%)·예체능(61.4%)·인문(58.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론(인문계 학생 중 90%가
논다)'이란 자조적인 말까지 나왔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되는
학과로 부전공·이중 전공하는 건 '필수'가 됐고, 남들 따라 '토익
점수' '해외 연수' 등 천편일률 스펙 쌓기에 매달리는 세태도
이어진다.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한 졸업생들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는 낮다. A 기업 인사과장은 "뽑고 싶은 인재와 뽑힌 인재 사이의
간극이 워낙 커서 재교육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OECD는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 때문에)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고, 필요 없는 공부를 위해 쓴 비용이 GDP의 1%(약 15조원)를 넘었다"고 분석했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산업
수요에 맞지 않는 인재 양성과 같은 문제를 바꾸기 위해선 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